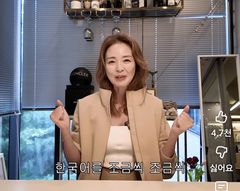AI 기술 급성장에 핵융합 수요 커져…선도국도 목표 10년 앞당겼다
한국, 핵융합로 건설·운전엔 강점 있으나 전력생산 기술은 초기 수준
![[서울=뉴시스]한국의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KSTAR(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 KSTAR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도록 1억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만들고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가둬두는 역할을 한다. (사진=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제공)](https://img1.newsis.com/2023/02/23/NISI20230223_0001202575_web.jpg?rnd=20230223121126)
[서울=뉴시스]한국의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KSTAR(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 KSTAR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도록 1억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만들고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가둬두는 역할을 한다. (사진=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제공)
[서울=뉴시스]윤현성 박나리 수습 기자 = 정부가 꿈의 청정에너지로 불리는 '핵융합' 핵심기술을 보다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핵융합 핵심기술 실증 및 첨단연구용 인프라 조성 사업을 약 1조20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기획을 마치고 12월 중 인프라 조성 사업 예비타당성 조성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전략 포럼'을 개최하고 기술 개발 추진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핵융합에너지 조기 실현을 위해 마련해온 핵심기술 개발 로드맵을 전문가와 국민에 공유해 점검을 받고, 로드맵을 보완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목표다.
이날 포럼에서 김태영 과기정통부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구체적인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술의 급성장과 데이터센터의 확대로 핵융합 에너지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만큼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등도 목표 시점을 당초 2050년대에서 2030~2040년대 전력 생산으로 앞당기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한국의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KSTAR(케이스타)'를 중심으로 하면서 핵심 기술 확보에 더 속도를 붙여야 한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판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전략 포럼'을 개최하고 기술 개발 추진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핵융합에너지 조기 실현을 위해 마련해온 핵심기술 개발 로드맵을 전문가와 국민에 공유해 점검을 받고, 로드맵을 보완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목표다.
한국, 인공태양 'KSTAR' 운영으로 강점 보유…약점인 전력생산 기술은 전주기 산·학·연 협력 강화
최근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술의 급성장과 데이터센터의 확대로 핵융합 에너지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만큼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등도 목표 시점을 당초 2050년대에서 2030~2040년대 전력 생산으로 앞당기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한국의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KSTAR(케이스타)'를 중심으로 하면서 핵심 기술 확보에 더 속도를 붙여야 한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판단이다.

국제 공동 핵융합로 'ITER(이터)'의 핵심 부품인 세계 최대 규모의 '토카막(Tokamak)'이 들어설 30m 깊이의 구덩이. (사진=ITER) *재판매 및 DB 금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인 KSTAR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국제 핵융합 실험로 'ITER(이터)' 사업을 주도해온 만큼 건설·운전 기술 분야에는 강점이 있다.
하지만 핵융합 기술을 활용한 전력생산을 위해 필요한 증식 블랑켓, 연료 주기 시스템, 핵융합 소재 등 분야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로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핵융합로의 극한환경에서 핵심 기술 시험·검증을 위한 첨단 실증 시설도 없어 상용화 준비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현재 마련되고 있는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로드맵은 우리나라의 강점인 건설·운전 기술은 보다 강화하고, 약점인 전력 생산 기술은 더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 KSTAR 운영 경험을 통해 확보한 기존 대형 토카막 기술을 소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전력 생산 환경에 적용 가능한 핵심 부품·장비도 선진국 수준으로 확보한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핵융합로 소형화 핵심기술 고도화를 위해서는 AI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설계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핵융합 기술에 필수적인 초고성능 플라즈마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KSTAR 활용을 더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약점인 전력생산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설계·제작·검증 전주기 기술 개발에 있어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첨단 인프라를 활용해 핵융합 환경 내 시험·검증도 진행해나간다.
이에 대해 김태영 과장은 "우리나라는 핵융합 분야에서 기술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력생산에 필요한 일부 핵심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은 아주 초기 단계 수준이다. 미래 상용화 시기 대응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의 역량 제고 등이 필요하다"며 "로드맵을 통해서는 핵융합 전력 생산 실증을 위해 필요한 8대 핵심 기술 목표를 설정하고 기술 확보 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핵융합 기술을 활용한 전력생산을 위해 필요한 증식 블랑켓, 연료 주기 시스템, 핵융합 소재 등 분야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로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핵융합로의 극한환경에서 핵심 기술 시험·검증을 위한 첨단 실증 시설도 없어 상용화 준비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현재 마련되고 있는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로드맵은 우리나라의 강점인 건설·운전 기술은 보다 강화하고, 약점인 전력 생산 기술은 더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 KSTAR 운영 경험을 통해 확보한 기존 대형 토카막 기술을 소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전력 생산 환경에 적용 가능한 핵심 부품·장비도 선진국 수준으로 확보한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핵융합로 소형화 핵심기술 고도화를 위해서는 AI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설계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핵융합 기술에 필수적인 초고성능 플라즈마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KSTAR 활용을 더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약점인 전력생산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설계·제작·검증 전주기 기술 개발에 있어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첨단 인프라를 활용해 핵융합 환경 내 시험·검증도 진행해나간다.
이에 대해 김태영 과장은 "우리나라는 핵융합 분야에서 기술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력생산에 필요한 일부 핵심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은 아주 초기 단계 수준이다. 미래 상용화 시기 대응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의 역량 제고 등이 필요하다"며 "로드맵을 통해서는 핵융합 전력 생산 실증을 위해 필요한 8대 핵심 기술 목표를 설정하고 기술 확보 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22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전략 포럼에서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오른쪽 네번째), 오영국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오른쪽 다섯번째) 등 주요 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https://img1.newsis.com/2025/10/22/NISI20251022_0001972453_web.jpg?rnd=20251022150859)
[서울=뉴시스]22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전략 포럼에서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오른쪽 네번째), 오영국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오른쪽 다섯번째) 등 주요 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핵융합 핵심 기술 개발 위한 첨단 실증 인프라 조성 추진…연내 1.2조 규모 예타 조사 신청
이같은 핵심 기술 개발과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첨단 실증 인프라를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조성하고, 확보가 어려운 인프라는 타국 연구시설까지 활용해 기술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현재 핵융합 핵심기술 및 첨단연구 인프라 조성사업 기획을 연구 중이며, 오는 12월 1조2000억원 규모 의 관련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핵융합 상용화를 대비해 핵융합 전문 연구기관을 핵심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거점으로 삼는 등 연구생태계를 보다 체계화하고, 핵심 기술별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단순히 연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핵융합 분야 전문인력 양성도 병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중 국가핵융합위원회에서 핵융합 핵심기술 확보 추진방향과 로드맵을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 이후에도 5년 단위 연동 계획을 수립해 핵융합 핵심 기술 관리 체계를 더 고도화하고, 신규 R&D 사업 기획 등을 통해 예산 확보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후 내년 말에도 핵융합 에너지 실현 가속화를 위한 상세 일정과 전략을 재차 제시할 방침이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이날 포럼에서 "핵융합은 인류가 꿈꿔온 궁극의 청정에너지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핵심기술을 확보해 나간다면 우리나라가 핵융합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산·학·연과 국민의 지혜를 모아 실효성 있는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로드맵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